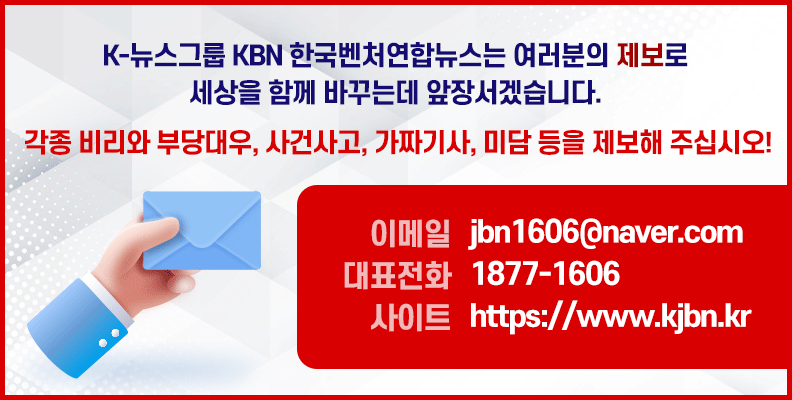<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김택천 |
(사)함께하는 스포츠포럼 이사장 김택천
서울은 겉만 화려한 도시가 아니다.
천년의 시간이 겹겹이 축적된 자리 위에 산업화가 올라탔고, 그 위에 K-콘텐츠가 다시 숨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서울의 경쟁력은 언제나 ‘새로운 것’만이 아니라 축적된 삶의 밀도에서 나왔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도시의 심장에 들어설 문화의 기준을 ‘사람이 얼마나 사는가’가 아니라 ‘건물이 얼마나 멋진가’로 바꿔버렸다. 동대문운동장의 철거와 DDP 건설이 바로 그 상징이다.

동대문운동장은 그저 낡은 경기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서울 시민이 함께 환호하는 법을 배우고,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경기를 보며 같은 이야기를 나누던 장소였다.
토요일 오후의 표 사는 줄, 경기 끝나고 쏟아져 나오던 사람들의 발걸음, “오늘 누구 나와?” 같은 사소한 대화들이 쌓여 도시의 문화가 됐다. 문화라는 건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다. 거창한 슬로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방문과 기억의 누적으로 커진다. 동대문운동장은 그 누적을 가장 오래, 가장 많은 사람에게 제공한 공간이었다.
그런데 2008년, 그 생활의 무대가 사라졌다. 대신 DDP가 들어섰다. 물론 DDP는 화려하다.
사진이 잘 나오고, 곡선은 눈길을 끈다. 하지만 도시는 사진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도시를 움직이는 건 ‘방문객 수’가 아니라 ‘생활자 수’다. 시민이 습관처럼 드나들고, 시간대별로 목적이 생기고, 아이와 노인까지 쓰임이 분명할 때 그 공간은 비로소 도시의 일부가 된다.
DDP는 끝내 그 자리까지 가지 못했다.
행사와 전시가 열리는 날엔 북적이지만, 그 바깥의 날들에 시민의 일상이 얼마나 뿌리내렸는지 물으면 답이 선명하지 않다. 동대문이 원래 품고 있던 체육과 대중문화의 결은 이어지지 못했고, 그 틈은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보인다.
여기서 핵심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 “DDP가 예쁘다/안 예쁘다”가 아니라, 서울이 스스로 끊어놓은 문화의 연속성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의 문제다. 문화는 건축물이 아니라 연속성이다.
어제의 경험이 오늘의 습관이 되고,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전통이 되는 것. 동대문운동장을 없앴을 때 서울이 잃은 건 콘크리트 몇 만 평이 아니라, 그 연속성을 가능하게 하던 ‘장(場)’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 서울이 문화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갖추려면 DDP 해체를 포함한 전면 재구성을 논의가 아니라 실행의 의제로 올려야 한다. 해체는 파괴가 아니다. 잘못 끼운 첫 단추를 인정하고, 끊어진 도시의 흐름을 다시 잇겠다는 선언이다. 더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는 ‘단절’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순간부터 서울은 과거를 자산으로 쓰는 도시가 아니라 과거를 정리하는 도시에 머물게 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서울 돔’이 들어서야 한다. 단, 또 하나의 거대한 건물이 아니라 생활을 복원하는 엔진이어야 한다. 낮에는 시민 체육과 학교 경기, 지역 대회가 돌아가고, 주말에는 프로 스포츠와 대중 공연이 열리고, 계절마다 국제 행사와 도시 축제가 이어지는 구조. 이렇게 되면 동대문은 다시 “사람이 모이는 곳”이 된다.
스포츠는 세대를 묶고, 공연은 도시의 밤을 살리고, 축제는 관광을 만들고, 반복되는 방문은 상권과 일자리를 낳는다. 말 그대로 문화·경제·공동체가 한 번에 돌아가기 시작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이 다시 그 공간에 추억을 저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화려하지만 공허한 전시 행정의 유혹을 끊고, 시민의 삶 속에서 숨 쉬는 문화와 체육을 복원하는 길로 가야 한다. 동대문을 되살리는 일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서울이 어떤 도시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선언이다.
그런 점에서 전현희 서울시장 후보의 DDP 해체 공약은 찬반을 가르는 구호가 아니라, 서울의 문화적 정체성과 경제적인 경쟁력을 어디서부터 다시 세울지 그 자체에 관한 질문이다. 도시의 중심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제 서울은 사람을 중심에 다시 놓아야 한다.